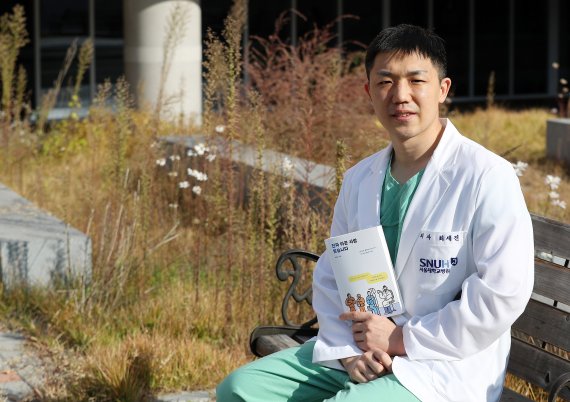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교도소 그리고 구치소. 우리는 그곳을 사회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이라고 부른다. 사람을 속이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스물아홉 청년 최세진씨는 2018년 그 밑바닥을 제 발로 들어갔다. 수용자는 아니었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군 대체복무로 일하게 된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1지망으로 교정시설을 택했다.
교정시설은 공중보건의 모두가 기피하는 근무지. 3년 간의 교정시설 생활을 담은 에세이 '진짜 아픈 사람 맞습니다'(어떤책)의 저자 최세진씨(32·서울대병원 인턴)를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나 왜 교정시설을 근무지로 택했는지 물었다. 최씨의 답은 간단했다. 그는 "의료 소외 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밀집된 교정시설은 어떤 곳일까 궁금했다"며 "호기심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호기심에 가게 된 교정시설의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순천교도소와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광주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까지 돌아다니며 공중보건의로 활동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거울을 깨고 자신의 손목을 긋고, 같은 수용자와 싸워 다치고, 마약에 빠져 시골에 사는 지팡이 짚는 어머니에게 처방전을 떼오라고 하는 사람까지.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에게 거짓말하는 건 기본이었다.
최씨는 "그들을 대하다 보면 환멸감이 들기도 한다"면서 "동료 의사나 교도관들이 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나도 지속적인 자기 수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의사'라는 점을 떠올리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다짐했다.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들도 '의사'에겐 교정시설 밖 병원을 찾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에 '피해자가 있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며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최씨도 "수용자들은 범죄를 저질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환자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가 범죄자로 만든 수용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치료해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랐다면 범죄자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을 거라고. 제대로 된 변호사나 지원해줄 가족이 있었다면 범죄를 행하기 전 병원에 입원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여기에 와있다고. 정말 범행 의도를 가지고 범죄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중독 환자도 마찬가지죠. 서울구치소 수용자는 2700명 정도인데 늘 10% 정도는 마약환자예요. 의대 다니면서 배운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한 수치죠. 이런 사람들을 교정시설에서조차 치료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교정시설에서의 3년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성장한 그에게 다가온 또 다른 세계였다. 그렇게 최씨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며 돈을 버는 '보통 의사'의 길을 밟는 대신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의사의 길을 택했다.
최씨는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다. 비록 교정시설에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은 결국 통한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제게 말해요. 범죄자에게 감정이입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전 현재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이상조차 없으면 사회가 너무 각박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일, 그게 결국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 아닐까요."
